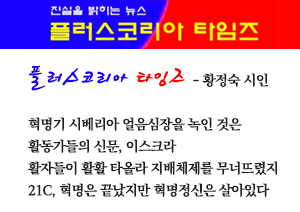|
<박종규 단편소설> 초 록 반 지 (3회)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라~.”
병영에 들어 온 장사꾼의 호객소리가 아니었다. 병영훈련에서 만날 수 있는 장사꾼은 모포 부대 뿐이다. 모포 부대란 훈련생들이 오르는 산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불쑥 나타나 훈련생들을 유혹하는 여인들을 말하는데, 그녀들은 간단한 음료수와 모포를 휴대하고 다닌다.
민간인은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외진 산골에서 더구나 치마 두른 여인이 나타나 젊은 청년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짧은 짬에 여인네와 음료수를 마시면서 데이트를 즐기고, 말이 통하면 모포 자락을 편다는 것이다. 모포 부대에 대한 사전지식은 있었으나 이곳에서 그녀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었다.
눈은 감고 있으나 피로가 몰아치는데도 잠들 수가 없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되풀이되는 저 소리 때문이다. 지금 도대체 몇 시나 되었을까? 저 녀석들은 어쩌다 저 고생을 하며 남까지 잠 설치게 하나. 한 녀석 목소리는 천하의 고문관 천태평이 틀림없으나 다른 목소리의 주인공은 우리 소속 부대원이 아닌 것 같았다.
보나 마나 취침시간에 매점에 들려 사이다와 콜라를 사 마시다 들켰을 것이다. 아까운 음료수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애꿎게 동료 잠자리까지 침범하고 있으니, 마음고생인들 오죽하랴! 그래도 옆자리 한영수 후보생은 큰 입술을 헤벌리고 코까지 드르렁거렸다. 그에게 육신의 피로는 귓속으로 파고드는 소리의 수면장애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나 보다.
벌써 30분은 지난 것 같았다. 두 녀석은 이십 킬로가 넘는 군장을 걸머지고 수통을 떨그럭거리며 내무반 막사를 계속 돌고 있었다. 30여 분간을 나도 저 녀석들과 같이 막사를 돈 셈이었다. 계속 녀석들의 소리를 쫓아다니다 보니 앞 녀석이 ‘사이다’ 하면, 뒤 녀석의 ‘콜라’라고 되받는 소리를 기다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은 채로 앞소리와 뒷소리의 간격에 신경을 쓰느라 잠을 못 이뤘다. 이 얼차려는 본인들에게는 수치심을 유발하고, 동료 잠까지 설치게 하는 등, 단체 징벌의 효과까지 있다.
“사이다~.” “콜라~.” “저녁 안 먹었나? 목소리 키우라.”
김 중위였다. 어디선가 ‘아이고 지겨워’라는 투정이 모포 속으로 감겨들었다.
“이 새끼들아, 목소리나 좀 죽여라! 제바 ~ 알.”
구대장은 목소리 키우라 하고, 막사에서 잠을 설치는 대원들은 소리를 죽이라 했다. 하기는 녀석들인들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 삼 분만에 짬밥 허둥지둥 먹어치우고 온 종일 전술학이다, 사격술 훈련이다, 박박 기고서 지금은 그 몸 좀 풀어주어야 할 시간에 완전군장 구보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동료한테는 얼마나 미안하며, 속으로는 구대장을 얼마나 원망할까.
“오늘 주번 사관 누 꼬?”
좀 전까지 코를 드르렁거렸던 한영수 후보생이 시체가 관에서 일어나듯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툭 쳤다. 녀석도 깊은 잠은 못 들었나 보다.
“목소리 못 들었어? 빤하잖아, 김 중위지 누구겠어!”
“어이고, 그 인간!”
“그 작자는 잠도 없나 봐!”
“구대장들은 정말 이상해! 어떤 때는 인간 같지도 않더라고. 똥도 안 누러 가고, 밥도 안 처먹는 것 같잖아?”
“그러게 말이야.”
“아니, 전쟁할 때는 똥 안 눠야 하나?”
“저 작자야말로 포탄 쏟아지는 전장에서도 뒤 깐 찾을 인간이지! 쓸데없는 소리 치우고 어서 자자.”
“아니, 저 녀석들 정말 밤새울 모양인가?”
“김 중윈가 하는 인간, 언제 한번 들이받아야겠어.”
한 후보생도 유대관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말로 끝나야지 정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그 피해는 모든 부대원에게 돌아갈 것이다. 사적인 감정은 통하지 않는 곳이 군이라는 조직이다. 그런 일에 적응하는 것도 훈련이다.
“여긴 군대야. 아래서 위를 치받는 것은 하극상이라고 가장 큰 죄가 되는 거 몰라? 전쟁 중에 하극상이 일어나면 현장에서 총살이라잖아. 배알이 아무리 꼴려도 평생 저 치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 이런 거 참는 것도 훈련이야. 피 교육생인 우리가 참아야지 별수 있어?”
내가 목소리 톤을 죽이며 말하자, 녀석도 목소리를 죽여 속삭였다.
“그건 나도 알아. 우리가 멍청이냐? 쥐도 새도 모르게 테러를 가하고 감쪽같이 숨어버리는 거지. 지가 망신스럽게 맞았다고 떠벌리겠니? 장교는 국제 신사라잖아. 그 치 하는 꼴을 좀 봐. 이러다간 우리까지 우스개 후보생이 되고 말 거야. 몇 명이 짜 논 각본이 있어. 약간의 테러를 가하여 생각을 고쳐먹게 만들자는 거지. 퇴소 날짜가 다가오니 그 전에 꼭 실행해야 해. 넌 모범생이니까 끼워 주지도 않을 테니 걱정 마. 지금 내가 한 말도 없었던 거고. 알겠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자. 이제 막장까지 다 왔잖아?”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한영수는 모포 자락을 와락 뒤집어쓰면서 못내 참지 못하고 몇 마디 덧붙인다.
“개 쓰끼, 자기 출신 티 내는 거야. 대학 못 간 분풀이를 왜 우덜한테 하고 지랄이냐고! 지랄 옘병 났다고, 안 그래? 꼭 돈 있어야 대학 들어가니? 돈 없으면 공부 잘해서 장학생으로라도 들어오지. 내 말 틀렸냐고?”
모포 속에 갇혀서 내뱉는 볼멘소리는 울화가 더 베어났다.
김 중위, 얼굴은 펑퍼짐 한데 눈초리가 약간 올라가 있다. 시간이 갈수록 그가 가진 모든 특징이 미워졌다. 얼굴이 밉상은 아니었는데 차츰 밉상으로 변질해갔다. 그뿐만 아니라 미운 걸음걸이, 미운 지휘봉, 반반해 보였던 낯짝은 못생긴 생쥐로 바뀌어갔고, 멀쩡했던 목소리는 이제 깡통 굴리는 소리가 되어 우리를 소화불량 증후군으로 몰아갔다.
이웃 구대장 박 중위는 같은 청색 반지 출신인데도 때때로 자상한 구석이 있는 낌새여서 상대적으로 친근감이 더 느껴지는데 도대체 이 인간은 돌멩이였다. 자기와 구대원들 사이에 하루하루 원망의 담을 쌓아가는 꼴이었다. 처음에는 교육목적상 의도된 통솔방식이려니 생각하고 잘들 따라줬으나 도가 지나치니 이제는 한 마디로 웬쑤, 그 자체였다.
그 치의 대학 못 간 열등의식을 받아 내야 하는 우리가 운이 없다고 체념도 했다. 그리고 그런 작자를 일부러 배치했으리라 인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반발심만을 부추기는 꼬락서니를 어떻게 군사 훈련 성과와 연관시킬 수 있을까?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규 관련기사목록
|
연재
많이 본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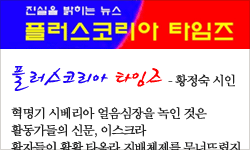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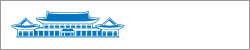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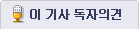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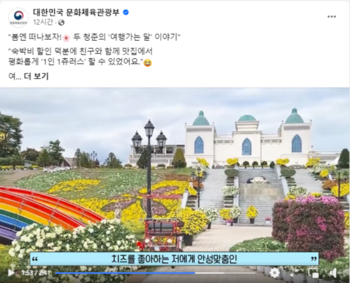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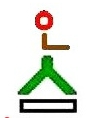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