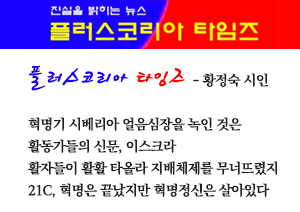|
<박종규 단편소설> 하얀 도화지 (3회)
다음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하겠다는 청렴 약정서까지 써서 제출했고요. 역시 개혁팀이라서 일체의 부정이 생길 요소를 차단하는구나 싶어 느낌이 괜찮다며 조 실장은 마음을 달리 먹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그쪽 스텝이 정말 우리 회사의 실력을 인정하는 듯,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하긴 자기들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혁신하자는 것이니, 광고 아이디어 선정도 좀 특별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스텝은 일 자체를 즐기는 편이랍니다. 신 나는 일이면 알아서 밤을 새우고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그러나 이래저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딴죽이나 걸면 그쪽 수준에 적당히 맞춰 여줄 가리로 전락시켜 버리는 예도 있답니다. 광고세계에서 우리는 크리에이터로 불립니다. 크리에이터라는 말은 광고 디자이너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명패나 다름없지요.
Creator, 창조자!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습니까. 실제로 세계의 모든 문화 코드는 크리에이터들의 발상으로부터 생성된다고 믿는 우립니다. 전문가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비전문가로 구성된 결정권자들이 수용하지 않거나, 자기들의 아이디어대로 광고를 만들라고 할 때 광고를 망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시청자들, 혹은 소비자의 입장을 연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돈 들여 일을 맡길 이유가 없지요. 처음부터 자기들 아이디어대로, 부리기 쉬운 프로덕션에 시켜서 만들면 될 일이니까요. 다행히도 이번은 ‘과연 개혁팀답구나!’ 싶을 정도로 담당하는 사람들의 매너도 깍듯하고 외골수 티를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쪼잔한 것조차 국민이 낸 세금 아껴 쓰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요. 우리는 그들이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두 가지 시안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그림의 터치가 중요합니다. 이번 시안에는 수채화 풍의 애니메이션에 감성을 자극하는 음원이 뒤를 받쳤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아이디어에는 광고주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녹아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조 실장의 주장이었지요. 그래야 실행 단계에서 풀어가기가 수월한 법이라고. 그들의 기대치를 높여줌으로써 최종 시사회에서 자기들도 이 작품 제작에 참여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마지막 결정하는 순간에 긍정적인 마음이 들게 된다는 논리랍니다.
첫 번째 시안은 우리 스태프들이 미는 안(案)이었고, 두 번째 시안은 광고주의 입김을 반영한 안이었습니다. 역시 첫 시안에는 별 반응이 없었으나 두 번째 시안에서는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쪽 팀장의 의중이 반영된 시안이었고, 팀장은 그 사실을 넌지시 나타냈으며, 이 말을 알아차린 팀원들이 ‘줄줄이 사탕’ 반응을 보인 것이지요.
그땝니다! “사실 저희가 욕심을 내는 작품은 첫 번째 안입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면 좋았을 것을, 조 실장이 봉창을 두드리고 말았답니다. 첫 안의 작품성을 설명하면서 두세 번 거듭 보여주니 서서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첫 안도 좋다는 반응을 끌어낸 것이지요. 전파광고의 특성은 그렇답니다.
짧은 일화를 빌어서 이삼십 초 안에 메시지를 담아야 하는 고도의 테크닉 작업이기에 되풀이 보여주어 눈에 익게 하면 좋아 보일 수 있답니다. 윗자리에 앉은 팀장이 손뼉을 치자 나머지 팀원들에게 박수가 전파되었습니다. 박수도 자기 판단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박수였지요.
결국, 선임자는 둘 다 좋다고 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나의 안을 버리기가 아깝다면 두 개를 다 제작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투자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두 개나 냈는데, 한 작품을 사장하는 것은 낭비일뿐더러 개발한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검정새치 봉창 두드리는 소리였지요. 제작비만 두 편 값을 제대로 준다면 누가 뭐랄까요. 두 편 제작이 다시 거론되었습니다. 우려하던 일을 자초한 조 실장은 아차 하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20회 정도밖에 방송에 내보낼 수 없는데, 그것을 두 편으로 갈라 방영하면 효과는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들 대못박이들은 두 가지나 만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접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성과에만 길든 조직의 한계가 들여다보이는 장면이랄까요! 결정적인 대답을 미루고 회사에 돌아와서 일정을 체크 해 보니 그동안 협의하다 보낸 시간 때문에 한 편 만들기도 빠듯했습니다.
조 실장은 스텝들에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니 아무 생각 말고 한편 제작에만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이튿날, 조 실장은 여주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편 모두 제작하라는 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윗선의 지시이니 달리 방법이 없다고. 대신 다음에 다른 일에서 손해를 보전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답니다. 우린 난감했어요.
시간은 없는데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면서 끙끙 앓이를 할 수밖에요. 조 실장은 더욱 난처해했습니다. 청과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음은 더 말할 나위 없었고, 회사는 회사대로 조 실장이 브레이크가 걸리니 다른 일조차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편은 우리가 만들고 다른 한 편은 외주 처리하여 우리 회사에서 제작비를 부담하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청이 다른 프로젝트를 주어 사후에라도 제작비용을 보전해 준다면 그럴 사 한 해결책이었지요. 계약한 대로 한편만 준비하라고 선을 그었던 사장님도 청에서 어떻게 나올지 걱정된다며 조 실장에게 외주를 검토하라 했고, 조 실장은 어떤 프로덕션에 외주를 줄까,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했답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규 관련기사목록
|
연재
많이 본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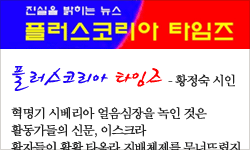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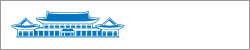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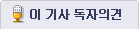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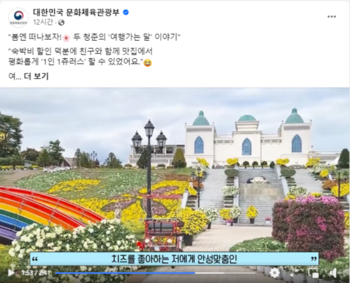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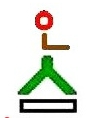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