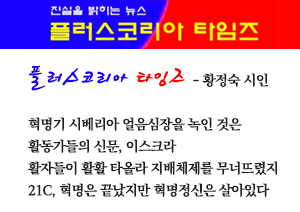그는 1926년 10월28일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를 버리고 젊은 여자와 재혼한 아버지에게 학교 등록금 문제로 대들었다가 관계가 틀어져 진주여고를 1년 늦게 졸업했다고 한다. 여고 졸업 후 46년 결혼한 그는 6.25 전란 중 남편이 납북되는 바람에 홀몸이 됐고 전쟁 직후 아들을 잃는 단장의 슬픔을 겪었다. 그 무렵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상업은행 본점에 다니다가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돈암동 집을 찾아가 두세 편의 시를 보여줬던 것이 본격적인 문학 행보의 첫걸음이 됐다. 당시 김동리 선생은 "상은 좋은데 형체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시보다 소설을 써보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했다고 한다. 그 권유에 따라 단편 '불안시대'를 썼고, 55년 '현대문학'에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이어 '흑흑백백'이 현대문학에 추천 완료되면서 문단에 정식으로 등단했다. 초기 대표작인 '김약국의 딸들'(1962년)을 쓰면서 작가로서 두각을 나타냈고 '시장과 전장'(64년), '파시'(65년) 등의 역작을 잇달아 발표했다. 특히 69년부터 94년까지 장장 25년에 걸쳐 5부로 집필한 대하소설 '토지'(전 20권)는 그의 최고 역작으로 꼽힌다. 작가는 구한말부터 해방기까지 민족 수난의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인물의 이야기를 3만장이 넘는 원고지에 촘촘히 써내려갔다. '토지'는 몰락한 최참판댁의 유일한 후계자인 서희와 그의 남편이 되는 하인 길상이를 비롯, 700여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놀라운 증식력을 자랑한다. 2500여개의 독특한 어휘와 방언, 속담, 풍속, 제도 등을 담은 사전이 발간될 만큼 민족문화의 보고(寶庫)로 꼽히는 작품이며, 세번이나 TV 드라마로 만들어져 대중과도 친숙하다. 작가는 자신의 문학을 통해 '운명'이라는 추상적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어왔다. '토지'는 물론이고 '시장과 전장' '김약국의 딸들' '파시' 등의 주인공들은 모두 운명이라는 거대한 초인간적 힘 앞에 서 있는 문제적 인간들이었다. 작가의 개인적 아픔도 끊이지 않았다. 외동딸 김영주씨와 결혼한 사위 김지하 시인은 유신체제에서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이 때문인지 작가는 평범한 삶에 대한 선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생이 행복했다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며 "유명한 딸보다는 곁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게 효도인데 나는 불효막심했다"는 회한을 쏟아내기도 했다. 작가가 되기 직전, 고향 통영을 떠난 뒤 2004년까지 50여년간 그곳을 찾지 않았던 일화도 유명하다. "수줍음 많은 성격을 타고난 데다 창작활동에 몰두하느라" 바빴다는 것이다. '토지'의 주무대인 경남 하동 평사리 역시 집필기간 동안 한번도 찾지 않았다. "자료나 현장 답사가 작가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자료에 의존한다든지, 생생한 현장이 작가의 상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설명이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로 변한 긴 세월 동안 스스로를 글감옥에 가둬놓고 치열하게 원고지와 씨름한 삶이었다. 만년의 그는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설파했으며, 후배 작가들을 뒷바라지하며 '하숙집 아줌마'를 자처했다. 작가가 17년 동안 살던 강원 원주시 단구동 자택이 도시계획으로 사라지는 것에 반대한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으로 99년 6월 강원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 토지문화관 건물이 세워졌다. 이곳은 문학과 자연, 인생을 논하는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됐으며 문화계 인사들이 누구나 와서 머물며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낮에는 텃밭을 가꾸고 밤에는 글을 쓰는 담백한 일상을 영위했다. 2006년 5월에는 사재를 털어 귀래관이라는 이름의 창작전용 건물을 문화관 입구에 세우기도 했다. 여러 차례 그곳을 찾았던 소설가 윤대녕씨는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인사조차 받지 않으시면서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작가들이 먹을 반찬을 한두 가지씩 만들어 식당으로 내려보내곤 하셨다"고 회고했다. 고인은 또한 쓸 수 있는 기력이 남아 있는 순간까지 창작의지를 불태웠던 진정한 작가였다. 2003년 '토지'의 후속으로 '현대문학'에 지식인 소설 '나비야 청산가자'를 시작했으나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아쉽게 끝내지 못했고, 지난 3월에는 8년만에 '까치설' 등 시 3편을 역시 '현대문학'에 발표하기도 했다. '목에 힘주다보면 문틀에 머리 부딪쳐 혹이 생긴다/우리는 아픈 생각만 하지, 혹 생긴 연유를 모르고/인생을 깨닫지 못한다/낮추어도 낮추어도 우리는 죄가 많다/뽐내어본들 우리는 도로무익(徒勞無益)/시간이 너무 아깝구나'. 원주 토지문화관 1층에 걸린 이 글이 생전 주인의 성품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학 관련기사목록
|
연재
많이 본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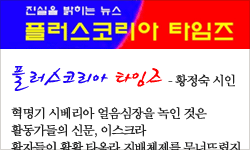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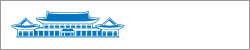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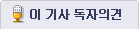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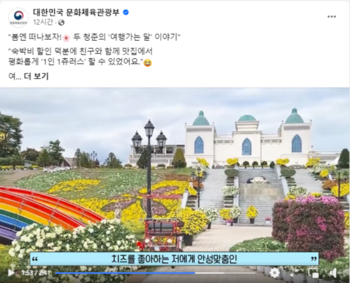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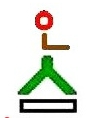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