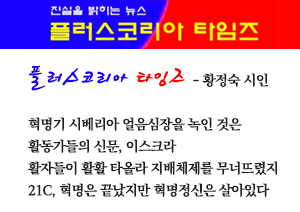|
2. 해덕은 강의를 마치고 앵초를 만나기 위해 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기다렸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따사로움이 느껴지는 날씨였다.
약속 시간 10분이 지나도 앵초는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리 위로 구름이 몰렸다. 저쪽 하늘은 햇살이 화안히 뻗혀 밝다. 구름은 그의 모습을 어둠으로 가두었다. 구름이 무서운 간악을 꾸미는 양 잘록한 모가지를 들고 그를 노려보고 있다.
순간 어제 밤, 드물게 헤걸음에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열고 들어서다 말고 크고 검은 거미가 그를 기겁하게 한 왕거미가 생각났다. 이 방안에 노릴 것이 무어 있다고. 차라리 꽃밭같은 성좌가 있고, 먼 무한궤도의 별소리를 들으며 은소리를 내며 매어달려 지주의 포망같은 순색의 뽀오얀 혈맥을 이 나뭇가지와 저 나뭇가지 사이에 매달면 풍뎅이 하나 걸려들고, 왕파리 하나 걸리고, 혹여 자유의 나라를 기폭처럼 훨훨훨 펄럭이며 황홀한 나비 한 마리 걸릴 텐데.
그는 방바닥을 두드리며 왕거미를 바깥으로 내쫒았다. 그 왕거미가 오늘은 구름이 되어 그의 심사를 거슬리고 있다.
얼굴을 찡그리며 검은 구름을 노려보고 있는데,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휴대전화를 꺼내 뚜껑을 열자 검은 구름이 훌훌훌 삽시간에 흩어졌다.
“해덕오빠, 얼른 모란으로 와요. 빨리요 빨리. 택시타고 와요. 어서.”
앵초의 다급하고 헐떡이는 숨소리에 무슨 이유인지 물을 수가 없었다. 직장인 잠실에 있어야 할 그녀가 이 시간에 성남엔 왜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밝아진 햇살의 허리를 밟으며 택시를 잡고 기사를 재촉해 모란에 도착했다.
모란역 2번 출구는 버스와 택시가 뒤엉켜 혼잡했다. 택시와 택시 사이를 비집고 그가 탄 차가 멈추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알려준 음식점으로 뛰었다. 둔탁한 그의 발이 지나가는 젊은 남녀 사이를 이리저리 피하느라 휘청거렸다. 젊은 남녀들이 내뱉는 뒤죽박죽 섞인 소리는 그의 귀에 앵앵거렸다. 눈은 간판 이름을 읽어내느라 고개를 쳐들어 사람들과 부딪칠 뻔했다. 그를 찾는 앵초의 전화벨 소리는 계속 울려댔다.
여전히 다급한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들어간 곳은 음식점이었다.
-금일 휴업-
이라는 팻말이 걸린 문을 열고 그가 들어섰다.
안은 의자와 탁자가 나뒹글고 음식과 그릇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음식점 한가운데 피 뭍은 종이를 들고 앵초가 앉아있었다. 평소 묶고 다니는 긴 머리는 풀어헤쳐져 젖가슴을 덮었다, 땀에 젖었는지 짧은 앞머리가 뒤엉켜 이마에 찰싹 달라붙어 있고 볼에 피가 말라있었다. 입술에서 나는 피를 쓰윽 닦아낸다는 것이 이마에 묻어 말라버린 것이었다.
그가 앵초 옆으로 다가갔다.
앵초의 허기진 눈빛을 따라 가보니 한 사내가 팔에 붕대를 감고 피가 방울방울 떨어져 있는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 음식점 안을 훑자 카운터에는 여주인의 분노에 가득한 눈동자가 앵초와 사내를 번갈아 바라보느라 번득거렸다.
그녀가 그에게 피 묻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연재
많이 본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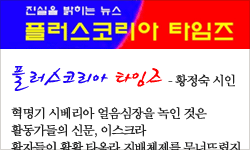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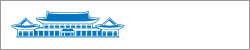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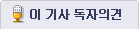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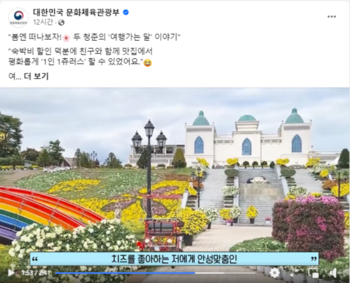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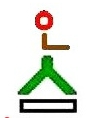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