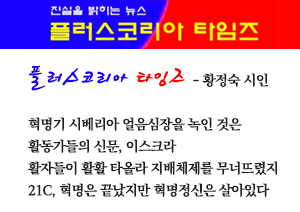보고 싶은 시(詩)야야 笑山 李 福 宰 네가 보고 싶은 건 가냘프게 핀 들꽃처럼 이름 없는 산과 들에서 웃음 띤 눈망울 작은 손 토끼풀 눈꽃으로 꽃 반지 만들어 가슴설레며 살포시 네 앞에 놓아두고 자꾸만 부끄러워 붉어지던 뺨 책보자기 둘러메고 고무신 양손에 들고 담박질로 들판을 가르며 징하게 가슴앓이 했던 일년 이년 삼년고개 오디랑 산딸기 따먹고 놀았던 나즈막한 산 파란하늘 꽃구름 솔기 솔기 피어난 들꽃이랑 친구하던 작은 손 아름다운 눈매 산보래기 옹달샘물 목축임만으로도 즐거웠지 난만히 쏟아지는 찬란한 햇빛 감꽃 목걸이 만들어 눈을 마주하고고 손을 잡아 입술시린 내 마음 담아 걸어 주었지 웃음 띤 눈망울로 날 쳐다 보던 시詩야야 병이 깊어 눈물 머금은 소녀야 익어가는 옥수수 감자 청아한 불빛 사이로 멋들어진 춤을 추어야 했고 너의 아픔으로 그 속에 별을 넣어 그렁그렁 울고 말았다 산기슭 해지는 노을 걸린 들길을 따라 주섬주섬 옛이야기랑 받아주고 넘어가는 이어풍(鯉魚風)은 추억의 뜨락을 돌아 다시금 간절한 계절이 되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재
많이 본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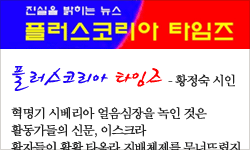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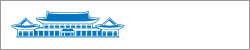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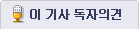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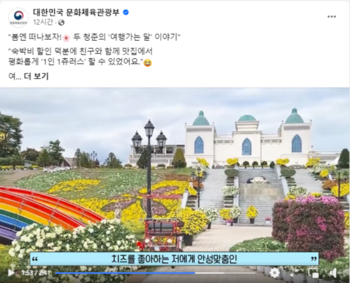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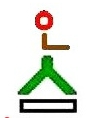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