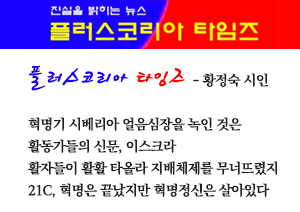|
[임서인의 중편소설] 곳고리 10회
그가 앵초 옆에 앉았다. 그가 머뭇거리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다. 그의 얼굴에서 멋쩍은 미소가 피었다.
“난 시골에서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이 고운 살이 새까맣게 타면 영락없이 시골뜨기가 될 것이고, 대학원까지 공부한 것은 어쩌라고요? 보세요. 오빠가 시골로 2년 전에 내려와서 지금 무엇이 나아졌죠? 검게 그을린 얼굴은 나이가 더 많게 보일 뿐이에요. 그 늠름하고 허울 좋은 모습은 어디 갔어요? 누구 한 사람 이 시골에 내려왔다고 환영하던가요? 오죽 못났으면 수많은 세월 박사 학위 받느라 고생한 것 헛것이라고 비웃잖… 읍∼.”
그가 그녀를 와락 껴안고 입술을 덮쳤다.
“앵초야, 어서 네가 왔으면 해. 난 이곳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 네 도움이 필요해. 시골에서도 도시에서 누리는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난 네가 아니면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 오로지 너뿐이야. 그렇지 않음 그냥 혼자 살 거야. 앵초야. 나랑 결혼해 줘.”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앵초는 그의 몸을 힘을 다해 떼어냈다.
앵초와 해덕이 연인이 된지도 10여년이 넘었다. 해덕이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몇 해를,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몇 해를 기다려 주었다. 그들은 사회에서 얻어내야 하는 갈망이 강했다. 서로에 대한 갈망이 컷을 때는 조금만 참자고 어르다가 꽃다운 청춘 다 보내었다. 그러다 불현듯 거꾸로 흘러가는 물줄기 하나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팽개치고 내려온 해덕은 아직도 앵초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해덕은 북한전문학자였다. 그의 친북에 대한 발언에 사람들은 그를 종북이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활동범위를 좁게 만들었다.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비판하고 햇볕정책을 옹호한 전라도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히자 그는 더 이상 학계에 남고 싶지 않아 미련 없이 낙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다. 도회지에서 그만한 학벌에 그만한 직장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청년들이 3포(결혼, 연애, 출산)가 아닌 인간관계 포기라는 것이 하나 더 얹혀져 4포 세대에 그의 무모함을 비웃었다. 앵초도 그런 해덕이 이해가 되지 않아 두 해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몸에 배인 그의 체취, 그녀의 귓불에 박힌 그의 음성, 그녀의 몸을 핥았던 그의 눈동자, 어느 것 하나 잊힐 리가. 자신이 죽거든 전통장례로 치르라고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유혹했던 것은 해덕이었다. 앵초의 아버지는 충분히 꽃가마 타고 하늘 길 갈만하다고 해덕은 온 동네에 소문내고 다녔다.
“부유하게 살지 못할까 봐 그러니? 인간은 자연의 일부야. 그 긴 손톱 다듬는 대신 저녁놀 곱게 타는 것 보아라. 니 마음 둥둥 구름에 태워 봐. 남들보다 조금 더 잘살기 위해서, 세금을 남들보다 조금 더 내는 것 자랑하기 위해서 눈치작전, 도시에서 사느라 잊었던 달, 별, 구름, 바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내 일상생활에 우주가 들어온 거야, 얼마든지 이곳에서 행복해질 수 있어. 넌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고 하지 않았니? 내 품이면 족하다고 말하지 않았니? 앵초야, 어서 와. 내게로 와. 어서 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앵초를 보았다.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한 거야? 난 오빠하고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오빠는 재미가 없어. 교수로 있을 때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니, 이제는 우주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거잖아. 달빛이 갈 꽃 같지 않니? 하고 물을 거잖아?”
앵초는 달빛조차도 질투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다. 해덕은 한번도 그녀를 예찬해 본 적이 없다. 브루스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 말야 실험관에서 만들어진 인간에게 가족,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이 불쾌한 말이라고 하는 국장이란 놈이 제정신인 인간이냐? 사람은 말이야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소서 -우리를 함께 달리게 해주소서- 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그게 인간이란 말이냐? 너도 입이 있으면 말해 봐. 너, 김태희가 입었던 옷이라면서 꼭 사야한다고 나를 끌고 백화점에 갔잖아. 제 정신인 여자냐고? 생김새부터 미래에 할 일까지 똑,같,이 만들어 버리고 어떤 분열도 허락하지 않는 사회를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고 말할 해덕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왔다.
하늘길 재촉하는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앵초의 서글픈 마음을 위로하기보다, 그녀가 비꼰 우주라는 말이 안 나올 리가 없었다. 2년 전, 마지막으로 만나던 날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투정부리던 앵초의 불만을 그는 지금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앵초야, 이 가슴에 불타고 있는 불은 너밖에 끌 수가 없어.”
뜻밖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이었다. 이런 말을 하다니, 앵초는 처음 듣는 그의 저런 말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혼란스러웠다.
“오빠, 난 지금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슬퍼. 생각할 시간을 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때, 앵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가 휴대폰을 받자마자 큰오빠의 비애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해덕은 앵초의 손을 잡고 얼른 차에 올라탔다. 아산병원으로 달리는 내내 앵초는 아버지의 이승에서의 마지막을 함께 있고 싶어 그를 재촉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연재
많이 본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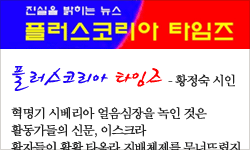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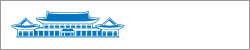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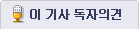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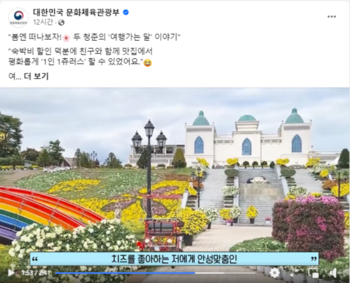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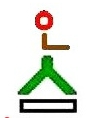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