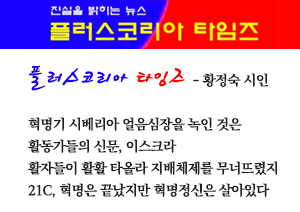항일독립투쟁의 성지 연변조선족자치주를 가다(9)
흥륭촌에서 반일,항일유격대창설을 준비
항일독립투쟁의 성지 연변조선족자치주를 가다(9)흥륭촌에서 반일,항일유격대창설을 준비
항일독립투쟁의 성지 연변조선족자치주를 가다(9)
류수는 대황구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우리는 시간 관계상 대황구 항일유적지는 가지 못하고 곧바로 소사하(현, 송강)로 향했다. 대황구 항일유적지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되면 다룰 것이다. 우리가 탄 버스는 대사하(현, 영경)를 지나 오후 3시 반 경에 소사하(송강)에 도착을 하였다. 대사하 항일유적지에 대해서는 답사 2일째인 10월 19일부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소사하(송강, 구안도)에 도착한 우리는 택시를 타고 흥륭촌(興隆村)으로 향했다. 우리가 탄 시외버스는 소사하(송강)가 종점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택시를 탈 수 밖에 없었다. 소사하 시내를 벗어나니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이미 지나온 연길이나 명월구, 신합, 만보, 류수 등에서 본 자연풍경과 확연하게 다르게 보인다. 산세(山勢)는 마치나 정리하지 않은 낮은 벌판이 펼쳐지는 듯 하고, 산이라고는 하지만 드넓으면서도 펑퍼짐한 낮은 구릉의 풍경들이다. 필자는 솔직히 그 순간에도 그 곳이 백두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 줄을 몰랐다.
산이라고 해도 정상(頂上)이 어디인지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그저 낮은 곡선처럼 연이어 있다. 또 오르막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가파르지 않았고 또 산에 흔히 있어야할 나무들이 전혀 없었다. 그저 누렇게 말라버린 옥수수대의 풍경만이 바다처럼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 풍경은 마치나 바닷물이 드넓게 출렁이는 파도와 같았다. 그러다가 간혹 산같이 약간 뾰족한 꼭대기를 보이는 곳도 드문드문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 동안 해외를 수도 없이 다녀온 필자이지만 그와 같은 풍경은 처음 보았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한 것이 푸근한 어머니의 품 같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자식을 엄하게 키우는 어머니의 단호함 같은 것도 내보이는 풍경이 연이어 이어졌다.
다만 그 풍경이 지나치게 강냉이 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 좀 단조로운 감이 없지 않았다. 당연히 산이 있다고는 하지만 골짜기 풍경은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한 쪽으로는 낮은 지대에서는 좁은 물길이 있어 수량은 풍부하지 않지만 물이 흘러가고 있다. 물론 그러한 풍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조선반도 남쪽의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조선반도의 풍경은 백두산 유역의 풍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산과 들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며 골짜기 역시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물론 고원이라고 하는 지역들로 있지만 그 고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조차도 산과 들의 구분이 명확하고 골짜기 역시 누구라도 금새 알아볼 수 있도록 형성이 되어 있다. 아무튼 소사하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펼쳐진 풍경은 분명 그 동안 필자는 전혀 보지 못한 생소한 풍경이다.
사진. 1 흥륭촌(興隆村) 이정표
소사하를 지나 약 10분여 정도 가니 왼쪽으로 장백산 문물전시관이 있다. 우리는 당초 목적지였던 흥륭촌을 답사한 다음 돌아가는 길에 그 장백산 문물전시관을 들르기로 했다. 장백산 문물전시관을 지나 약 10여분 후에 “흥륭촌(興隆村)”이라고 씌어 있는 돌로 된 이정표가 있다. 이정표를 지나니 제법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물길의 형태가 나온다. 우리 눈에는 정겨운 마을 풍경이 다가온다.
흥륭촌 마을은 우리네 60년대 이 땅에서 보던 마을풍경과 같다. 마을 고삿(골목)은 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아 정겨운 흙길이었다. 또 길 양옆의 집들 주위에는 울타리가 둘러쳐있는데 대부분이 약 20~30여cm 정도 넓이의 판자로 만들어져 있다. 필자가 어린 시절에 살던 고향마을의 60년대 울타리는 대부분이 싸리 울타리 내지는 밤나무 아지(가지)를 베어다가 만들었거나 돌을 쌓은(사람 가슴 높이 정도) 돌담이 대부분이었다. 필자는 그 시절 마을 풍경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려올 정도로 곱고 아름답고 푸근하면서도 정겨움을 느낀다. 또 마을의 대부분의 집들은 초가지붕이었는데 그 초가지붕은 모난 데가 전혀 없는 모든 사람들을 포근히 감싸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 같이 포근하게 감싸주었다. 아마도 우리겨레는 거주하는 시설마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고 모난 데가 없는 사람으로 키워주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마을 고삿(골목)에서는 우리와 한 울타리 안에서 항상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앙증맞게 예쁜 닭들이 몇 마리씩 무리를 지어 모이를 쪼아 먹으면서 천천히 자리를 이동을 한다. 또 가끔씩 강아지들이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눈을 들어 바로 앞을 내다보면 소를 메어놓은 정겨운 풍경들이 펼쳐졌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 마을은 동화 속 풍경보다도 더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물론 그보다는 못하지만 우리가 들어선 흥륭촌의 마을 풍경에서 어린 내 어린 시절 고향마을 풍경이 연상이 되었다. 마을 고삿으로는 토종닭(우리네 전통 닭이었다.)들이 무리를 지어 모이를 쪼아 먹으면서 왔다 갔다 한다. 또 강아지들(이 역시 우리네 전통 개)이 모르는 사람이 왔다고 올려다보는 풍경 역시 정겹기 그지없다. 또 동네 한 복 어느 집 울타리 밖에는 말을 메어 놓았다. 아무튼 눈에 보이는 흥륭촌 마을 풍경은 이 땅에서는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으며, 사라져버린 아름답고 정겨운 마을 풍경이 펼쳐졌다. 마치 내가 4~50여 년을 거슬러 60년대 내 고향마을에 온 착각이 들 정도였다.
사람들 역시 비록 조선족이 아닌 한족이기는 하지만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마을을 방문한 손님들을 쳐다본다. 물론 그 표정에는 그 어떤 경계심도 없다. 그저 마음씨 좋은 표정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방문한 손님들이 궁금한 듯한 표정이다. 과거 우리 역시 자신들의 마을에 손님이 오면 그렇게 궁금해 하면서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흥륭촌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풍경들이 어린 시절 내가 살던 고향의 풍경들과 흡사하였다. 비록 그 곳에 내가 태어나고 살았던 고향은 아니지만 근 40여년 만에 고향의 정겨운 풍경을 보았다.
사진. 2, 3 흥륭촌 마을 고삿(골목) 풍경
흥륭촌 항일유적지 비석이 서 있는 장소로 올라가는데 약간 혼선이 있었다. 앞서도 여러 번 말 했듯이 대부분의 항일유적지들이 비록 높은 산정(山頂)은 아니지만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 여런 번 답사를 다녀왔다고 해도 수월하게 올라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우리를 안내하는 이송덕 선생 역시 잠시 혼선을 일으켜서 올라가는 길을 찾아 오락가락 하였다.
흥륭촌 마을에서 유적지 비석이 서 있는 산꼭대기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00여 미터 정도 되는 듯 했다. 100여 미터라고 하지만 산을 오르는 것은 무척이나 멀게 느껴진다. 강냉이 밭을 헤치고 어렵게 올라서니 연변조선족자치주차원에서 세운 비석이 나타난다. 무척이나 반갑다. 필자가 연변조선족자치주 반일·항일유적지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대하는 비석이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가 다르다. 사적비(史蹟碑) 앞에 다다르니 누군가가 꽃다발을 가져다 놓았다. 꽃다발을 보는 순간 필자는 상당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저 꽃다발을 가져다 놓은 사람 혹은 무리는 누구인가. 한족(漢族-중국인)들인가, 아니면 조선족(朝鮮族)들? 그것도 아니라면 북에서 온 답사자들인가. 이에 대해 이송덕 선생은 “북에서는 거의 답사를 오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 비석을 세운 사람들도 흥륭촌민 일동이다. 비석도 화강암으로 잘 다듬어서 정성들여 세웠다. 참으로 고맙기 이를 데 없었다. 흥륭촌에도 이제는 조선족들은 거의 살지 않는다고 한다. 아마도 흥륭촌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세웠을 것이다. 결국 본 비석은 흥륭촌에 거주하는 한족(漢族-중국인)들이 주축이 되어 세웠다는 말이 된다. 그것도 최근에 세운 것도 아니고 1993년도에 건립을 하였다.
우리는 항일유적지 비석 앞에서 사진 몇 장을 찍고 흥륭촌으로 내려왔다. 흥륭촌에서 바라다 보이는 백두산자락의 장엄한 특성들은 또 다른 묘미가 있다. 마을이 있는 곳에서 바라본 산정상은 높지 않고, 산비탈이 가파르거나 깎아지른 벼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들이 연이어 이어져 있다. 또 가끔 어떤 산의 한 쪽 면(面)은 깎아지른 절벽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 벼랑이 높거나 낮거나 하는 것은 별개이다. 백두산 자락의 산의 벼랑은 높다고 해도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그저 높아야 한 30여 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반일·항일유적비가 세워져 있는 산 역시 동북방향으로는 펑퍼짐한 등판으로서 비석 바로 옆에까지 밭을 일구어 강냉이를 심었다. 반면 물이 흐르는 시내를 접하고 있는 남쪽 방향과 남서방향은 깎아지른 듯 가파른 벼랑을 이루고 있다. 그 높이라야 겨우 30여 미터 정도나 될까 말까 하다.
사진. 4, 5 흥륭촌 항일유적지 비석
사진.6, 7 유적지비석 앞에서 바라본 백두산 끝자락 풍경
흥륭촌은 김일성 주석의 아버님이신 김형직 선생이 돌아가신 후 무송에서 안도현 흥륭촌으로 이사를 하여 잠시 살았던 곳이다. 이송덕 선생은 “김일성 주석이 본격적인 항일무장투쟁을 하기 위해 항일유격대를 출범하기 전 흥륭촌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유격대구성을 위한 기본조직사업을 하던 곳”이며, “또 이곳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강반석 여사가 《반일부녀회》를 조직하여 여성들을 반일에 길로 나서도록 사업을 하였다”고 우리에게 해설을 하였다. 일반 독자들은 김일성 주석 일가가 흥륭촌에 어떤 인연이 있기에 이사를 왔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흥륭촌이 왜 항일유적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북의 자료를 인용하여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기로 한다. 본 내용 역시 마치 소설 속 이야기처럼 우리네 전통 여인네들의 삶을 묘사하는 듯하다. 그 가운데에 우리 여인네들의 민족사랑, 조국을 사랑하는 강인한 마음을 엿 볼 수가 있다. 다소 길기는 하지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 부담 없이 보기 바란다.
❝ 나는 돈화강습을 끝내고 4월에 이미 안도에 가서 대중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적이 있었다.

|
연재
많이 본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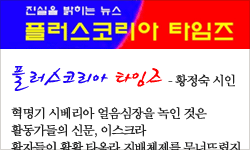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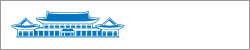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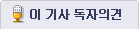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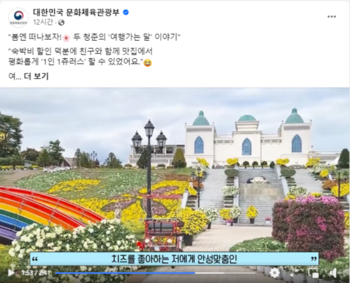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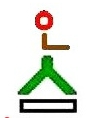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