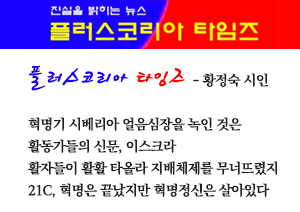|
[임서인의 중편소설] 곳고리 9회
해덕의 앵초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 앵초는 그가 자신을 더 설득하지 않는 의지박약함에 외면하기를 두 번의 눈꽃송이가 활짝 피고 졌다. 그녀는 부모를 만나러 몰래 만나고 올라갔다. 후에 이를 안 해덕이 그녀에게 원망의 문자를 덕지덕지 발라서 보냈으나 그녀는 외면했다.
앵초는 해덕을 쉽게 잊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숱한 남자를 만났으나, 그 누구도 자신에게 닻을 내리게 하지 못했다. 그녀는 영화와 연극 관람을 과도하게 보러 다녔으며, 어느 휴일에는 하루 종일 물건을 사러 다니는 중독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녀의 카카오스트리를 가득 메운 사진들은 화려한 향내가 나는 화장품들과,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느라 모델처럼 입고 찍은 사진은 전시관을 가득 메우고도 남을 만했다. 그녀로서는 차라리 하루를 견딘다고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애써 행복하려고 발버둥친 고달픈 하루를 억지로 재우고 막 잠이 들려는 야심한 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녀의 휴대전화가 사납게 울려댔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큰 오빠의 말에 새벽 미명에 아산병원에 도착했다. 다행히 아버지는 막내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아직 저승길을 미루고 있었다. 그녀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은 해덕은 자신을 보고 가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녀는 병원에 들렀다 집으로 왔다. 아직도 그녀의 방은 그대로 있었고 점점 작아지는 집은 낡아가고 있었다.
이부자리를 깔고 누워 어둠속에 묻혀 해덕을 생각했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도 해덕을 잊을 수는 없었다. 그의 손길이 잊혀가고 있었지만 그의 잔영은 그의 머릿속에서 그녀를 괴롭혔다.
간혹 머언 곳에서 들리는 개짓는 소리만이 짙은 봄밤을 재촉했다. 눈감고 어둠속을 응시하던 앵초는 번쩍 눈을 뜨고서 손에 들었던 휴대전화의 숫자버튼을 눌렀다. 숫자를 누르던 그녀의 희고 고운 손가락이 잠시 멈칫거리다가 다시 눌렀다. 굳게 다문 입술이 바르르 떨린다. 다시 살아나는 애증인가? 미련인가? 버튼을 누르는 손끝도 바르르 떨린다.
“저여요. 그곳에서 봐요.”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어둠 속을 더듬어 불을 켰다. 이번에는 실오라기처럼 남은 갈증마저도 끊어버리려는 각오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 한 올이 입술과 입술 사이에 끼었다. 살살이 퍼져 내린 곧은 선은 봉긋 솟은 유방을 더욱 빛나게 했다. 도시의 차가운 여인처럼 그녀는 시골 방에 어울리지 않았다. 퀴퀴한 냄새에 찡그린 얼굴이래도 아름다워서 한 송이 꽃이었다. 서른여섯, 향기로운 청춘을 그에게 바쳤었다. 불변의 사랑인 줄 알았다. 암벽을 오른다해도 그와 같이 오를 줄 알았다.
그녀가 달빛을 안고 도수로에 도착했다. 도수로 옆 야트막한 야산의 커다란 말뫼등 앞에 그는 벌써 도착해 있었다. 차가 옆에 세워져 있었다. 승용차의 헤드라이트를 켜놓았다. 앵초는 그의 시커먼 모습을 보는 순간, -님에게만 안기리라-하고 이태 전에 카톡으로 보냈던 문자가 지독히도 미워졌다.
“날 찾아 줘 고마워.”
그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느긋해진 말소리와 여유로운 태도에 그녀는 흠칫 놀랐다. 달빛에 젖은 그의 모습이 눈에 익자 앵초는 말뫼등 앞에 앉았다. 20여 년 전에는 그리도 빼곡히 들어찬 소나무조차도 이곳을 등지고 떠났는지 어쩐지 그리움으로 울음이 돈다. 도수로가 음침하게 쭈욱 뻗어 끝 간 데 없다.
도수로는 수력 칠보발전소가 출발지서 섬진강 물을 끌어들여 만들었다. 전기를 일으킨 잉여물로 계화도간척지의 용수공급을 위해 60년대 후반에 착공해서 70년대 초반에 준공한 용수공급용 수로이다. 일명 밀가루 공사였다.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에게 임금대신 밀가루를 주고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때 리어카가 이 동네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지게나 머리로 이고 지고 나르는 흙으로는 전표를 적게 받으니까 리어카를 구입하여 온 식구가 매달려 한포대의 밀가루라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수로에서 밤이면 청춘남녀들이 참새나 비둘기를 잡아서 구워먹고 서리를 해서 나눠 먹으며, 밤새 노래 부르고, 여자들을 불러냈던 곳, 사랑하는 연인과 몰래 데이트하며 사랑을 속삭이던 곳. 목욕하는 여자들을 훔쳐보기도 했던 곳. 그러나 지금은 개미새끼 한 마리 외면한다. 아무도 말뫼 등에 앉아 바람의 속삭임, 구름의 유회를 기억하지도 않아 우울증에 걸려 잡초만 무성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연재
많이 본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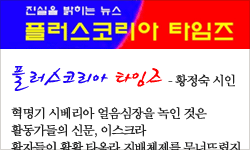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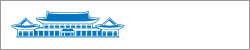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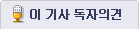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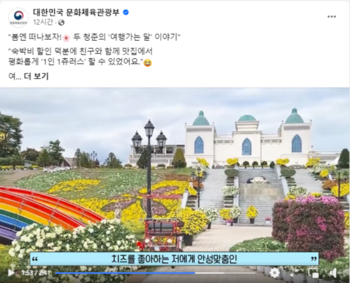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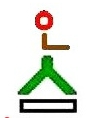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