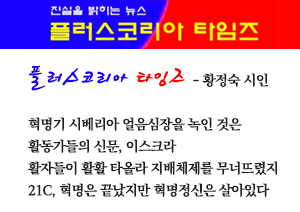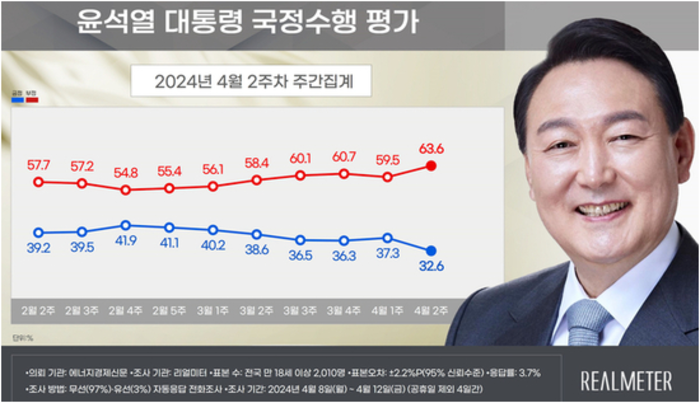|
[임서인의 중편소설] 곳고리 3회
망자와 산 자의 거할 곳이 다르니 상주들의 길게 늘어진 울음꼬리를 밟고서 한 사람씩 망자 곁을 떠났다.
“무슨 소리 들리지 않는가?”
늦봄, 망자의 집을 만드느라 흘린 땀을 닦으며 앉아있던 천만이 일어서려는 문해덕에게 물었다.
해덕은 목에 들렀던 수건 끝자락을 들어 이마를 훔쳤다.
“무슨 소리가 들린단 말인가? 배암구지 양반의 울음소리라도 들린단 말인가?‘
“삣삐비 삐비비비 삣삐비 삐비비비 그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인가?”
“그 소리가 이 마을을 떠난 지가 언젠데?”
“ 자네 집안의 과수원이 울창하고 도수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맘때면 합창처럼 들리던 소리였었지?”
“ 그땐 이 동네가 참 부유했지? 우리들의 함성조차도 꾀꼬리 소리만큼 하늘까지 울리곤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우는 소리조차 희미하니…….”
“ 나도 들은 소리네만 우리 마을이 유지앵소 명당으로 두승산 12혈지의 한곳이라네. 버드나무 가지에 꾀꼬리가 둥지를 튼 형국이라 거, 마을 앞에 있는 게눈박이 8방위 입석이 있는 거 보았지? 유지앵소의 마을은 쉽게 부자가 되고 쉽게 떠난다 하더군. 과수원에서 과일을 적과하는 처녀들의 노래소리인지 꾀꼬리 소리인지 그 소리가 어울러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배암구지 양반이 들려주더군.”
“맞네. 거부들이 많이 살았다 하지. 양조장을 영원면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흔앵이고, 정미소가 세워지고, 이 부근에 고등공민학교가 2년 동안 있다가 없어졌다는 말도 들었네. 우리 마을은 숲이 우거져야 흥한다고 전해지는데, 과수원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어내면서부터 마을이 쇠하기 시작했지. 자네, 내가 왜 그 좋다는 명예 버리고 궁벽한 이곳으로 돌아왔는지 아는가?”
해덕은 흔랑을 향해 몸을 돌려 앉았다. 그의 눈에 마을이 한 눈에 들어왔다. 집은 고만고만한 몸뚱어리를 하고, 그가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는 처음 사귄 여인처럼 어색했지만 지금은 다정하다. 그의 100년 넘은 어르신 팽나무가 기와 끝에 머물고, 그 아래 뙤얕볕이 빙들러 진을 치고 있어도 오가는 사람이 오늘은 없다.
한 무리의 사람들 사이에 앵초의 모습이 그의 눈에 머물렀다. 그녀의 냉랭한 모습에 그의 마음은 갇혀 있는 불처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하게 타오르고 있다. 그녀는 벌렁벌렁 도망가는 슬픈 흰나비였다. 때론 눈썹이 예쁜 암벌 한 마리였다. 아주 가끔, 표독스런 손톱으로 할퀴는 암 고양이다. 그런데도 그녀가 아니면 품에 안을 여자가 없다.
“이 사람아, 말을 하다말고 누구를 그렇게 넋을 놓고 보는가? 앵초는 이제 잊게나. 2년이란 세월이 무정도 하이.”
“그날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앵초의 모습을 핥아가던 해덕은 눈을 머언 하늘 끝으로 옮겼다. 그의 눈 끝이 아련히 떨렸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연재
많이 본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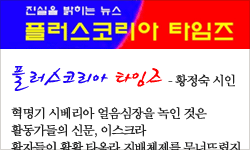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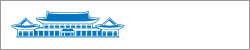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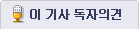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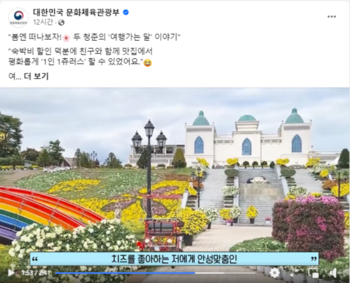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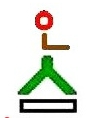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